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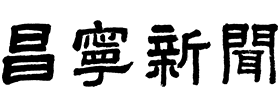
|
|
신돈(辛旽)에 대한 소고(小考)
智光 韓三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02일 입력 : 2018년 11월 02일
우리고장 영산 출신으로, 고려말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신돈(辛旽)에 대해
최근 들어 새롭게 재조명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신돈(辛旽)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승(妖僧)'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개혁가(改革家)'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갈라진다.
고려사 기록에는 '요승(妖僧)'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높지만, 기울어져
가는 고려를 일으켜 세웠다는 점에서 '개혁가(改革家)'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돈(辛旽)은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일찌기 공민왕에게 발탁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러한 인물이 말기에는 국정을 사사로이 농단
했다는 이유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 졌다.
결과적으로 신돈(辛旽)의 개혁은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몽주,정도전,조준 등의 인물이 그 뒤를 이어 계승해
나갔으므로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366년 당시, 공민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신돈(辛旽)의 벼슬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관명(官名)으로 알려져 있으며, 글자 수로는
무려 51자에 이른다.
"守正履順論道燮理保世功臣(수정이순논도섭리보세공신)
壁上三韓三重大匡領都僉議(벽상삼한삼중대광영도첨의)
使司事判重房監察司事鷲城(사사사 판중방감찰사사취성)
府院君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觀事(부원군제조승록사사겸판서운관사)"
바른 것을 지키고 순리를 따르며 서로 화합하여 잘 다스리는 공신으로, 정1품 최고의 귀족 명예직이면서, 국방, 법무, 종교, 기상등을 총 망라
하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벼슬이었다.
이러한 화려한 직책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역모 죄로 몰려 귀향, 1371년
49세(?)의 나이로 수원에서 심문 한 번 받지 않고 처형되었다고 전해진다.
많은 학자들이 고려사를 위서(僞書)라고 주장한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과도기에서 정도전은 고려사를
조작(造作)했고, 세종은 고려사를 개작(改作)했다는 주장이 있다.
신돈(辛旽)에 대한 역사 재조명 문제는 이미 MBC TV등 각 언론에서
방영이 이뤄졌고, 2017,11,24(금), (사)신돈 사상연구회(회장 신용태) 주최로
창녕군의 후원하에 학술대회까지 열린 바 있다
신돈(辛旽)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부정적인 기록은 차치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함과 동시 도탄과 실의에 빠진 백성들의 편에 서서
많은 애민활동을 펼쳤으며, 승려 신분으로서 불교개혁과 함께 성균관을 중건하는 등 유림의 신진 개혁 인물들을 발탁 등용시켰다.
역사학자 안정복이 그의 저서 '동서강목'에서 밝히고 있는 구절을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공민왕은 세상을 떠나 우뚝 홀로 서 있는 사람을 얻어 인습으로
굳어진 폐단을 개혁하려 했다. 그러던 즈음 신돈을 만나고 나서
그는 도를 얻어 욕심이 적으며 미천한 출신인데다가 일가친척이
없으므로 일을 맡기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여 눈치를 살피거나 거리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는 我(아)와 非我(비아)의 투쟁"이라고 피력했다.
역설적(逆說的)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 져야 하지만, 주관적인 기록
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歷史)는 지난 과거의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할 때 그 의미가
살아난다.
'사(史)'자를 파자해 보면, '사(史)'는 '중(中)'과 '우(又)'가 합쳐져
만들어진 會意(회의) 문자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바르다'는 뜻의 '중(中)'과 역시 '오른쪽' 또는
'바르다(right)'는 뜻의 '우(又)'가 합쳐져 만들어 졌다.
따라서 '역사(歷史)'라는 단어에는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공평하고
바르게 쓴 사람의 이야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역사를 쓰는 사람도 역사를 읽는 사람도 주관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배제되어야만 한다.
한 쪽 면만 보고 '전체(全體)'라고 착각하는 것을 두고 '편견(偏見)' 또는
'단견(短見)'이라고 말한다.
반면 어떤 것을 볼 때, 이쪽저쪽 앞과 뒤를 같이 봐서 전체(全體/全貌)를 보는 것을 두고 '통찰력(洞察力, insight)' 또는 '지혜(智慧, wisdom)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과 사물, 사건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다.
세상의 이치와 상황을 파악할 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볼 줄 아는
안목(眼目)이 필요하다.
"이해는 가장 잘 한 오해이고 오해는 가장 적나라(赤裸裸)한 이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의 역사관을 보면 역사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
질 때가 많다.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중국에서는 '동북공정'
이란 이름하에 역사를 아예 새롭게 만들고 있음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역사란 '과거를 보는 창(窓)이면서 지금의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이기도 하다.
원래 '동서남북(東西南北)'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東)이니 서(西)니 할 뿐이다.
~ 智光 韓三潤 ~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02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제/사회

칼럼/기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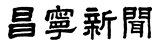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 천요강을 준 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