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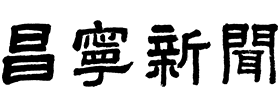
|
|
‘산불예방’ 365일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10일 입력 : 2022년 11월 10일
|
 |
|
| ↑↑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손대협 |
| ⓒ 인터넷창녕신문 |
|
흔히들 산불은 늦가을부터 봄까지(11월~익년 5월 15일) 주로 발생하는 계절성 화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불 감시원 배치, 헬기 임대, 산불 예방 홍보 등 산불관련 행정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실제로도 대부분 산불은 이 기간에 발생하므로 예산과 행정력 효율성 차원에서도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산림청에서 발간(2022.02)한 ‘2021년 산불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10년(2012~2021)간 산불 발생 건수는 4,809건으로 이를 시기별로 2월~5월에 3,345건 발생하여 70%정도 차지하며, 6월~10월에 700건 발생하여 14%, 11월~익년 1월에 764건 발생하여 16%로 통계상으로도 산불 집중 관리기간인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 약 86%로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산불 비화재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기간인 6월~10월에도 14%에 해당하는 700건이 발생되었으며 생각보단 꽤 많아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은 계획된 조림이 아닌 나무종류별로 군락지를 이루며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침엽수림지대와 활엽수림지대로 확연히 나누어 형성된 산, 음수림과 양수림이 서로 경쟁하며 형성된 산, 침엽수와 활엽수가 뒤섞여 형성된 산 등 다양한 형태로 어우러져 있으며 특히나 1980년대 이후 난방용 땔감이 나무에서 유체땔감으로 바뀐 이후부터 급속도로 산림이 울창하게 형성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헤치고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남미의 밀림지대처럼 온 산림이 변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시골에서 살 때 군불(음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방을 덥히려고 아궁이에 때는 불)용으로 생솔(마르지 아니한 소나무) 가지를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난다. 보통 사람들은 ‘생솔이라 젖어서 불에 잘 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타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화력은 엄청나게 세다. 녹음이 우거진 늦봄에서 초가을 까지는 침엽수림지대 특히 소나무 군락지에 큰 산불이 나기 쉬우며, 활엽수림대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낙엽이 지고 풀들이 마른 늦가을부터 초봄에는 침엽수와 활엽수 구분 없이 산불이 많이 발생하며 확산 속도 또한 매우 빨라 대형 산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여름초입에 발생한 밀양 산불은 몇 가지 교훈을 준다. 먼저, 산불 발생은 시기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례적으로 여름초입에 발생하였으며 1986년 산불 통계가 작성된 이후 2018년 8월 15일 경북 군위 우보면 두북리에서 30ha이상 피해가 발생한 건 외에 비화재기인 6월 초에 이처럼 큰 피해를 입은 산불은 처음이다. 그렇지만 밀양 산불 발생 며칠 전 울진 산불이 있었듯이 앞으로는 자주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름철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화재발생 장소가 계절에 상관없이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소나무(침엽수) 군락지란 사실이다. 화력이 워낙 세다보니 바닥보다는 소나무 잎만 먼저 타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다. 산림 형태에 따른 산불 진화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하겠다.
지금 한창 가을 추수철이다. 출·퇴근길에 들을 보면 농업 폐기물을 여기저기 쌓아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 ‘마르고 불에 잘 탈 정도가 되면 언젠가 태우겠지’ 생각하니, 산불 걱정이 먼저 떠오르는 건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 때문만은 아니라고 애써 되뇌곤 한다. ‘국민들 모두 똑같이 걱정하겠지’ 라며, 농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농민들의 마음도 덜어 주어야 하겠다. 앞으로는 큰 산불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10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제/사회

칼럼/기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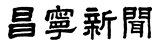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 천요강을 준 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