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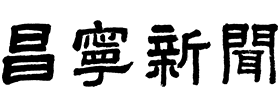
|
|
권유관의원 5분 자유발언
4대강 사업, 이제 활용을 고민할 때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30일 입력 : 2016년 09월 30일
 |
 |
|
|
| ⓒ 창녕신문 |
| 본 의원은 남지면 강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낙동강과 함께 생활해 왔기에 4대강 사업의 공과 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명으로
4대강 공사 과정의 일부 부족했던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는걸 보면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피해가 예방되어 혜택을 본 사람들마저도 아무 말도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폄하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으로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하였다.
그리고 녹조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에 포함된 질소, 인 등 영양염류와수온상승, 일사량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만일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체류시간이 녹조 발생의 절대적 조건이라면, 낙동강보다 체류시간이 훨씬 큰 소양강 댐에는 왜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정치적 입장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공과 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할 때다.
우리나라는 7, 8월 두 달동안 연간 강수량의 70%가 집중되다 보니호우 피해와 가뭄피해를 연례 행사처럼 입어 왔다.
특히, 대형 태풍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두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246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5조 1,479억원이라는 재산 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항구적인 예방 조치가 아니라 땜질식의 복구공사만 시행하였기에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에도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4대강 주변의 지자체들은 4대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호우 피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견디다 못한 창녕을 비롯한 4대강 주변의 지자체에서는 땜질식의 복구가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2003년 42조 8,000억원, 2007년 87조 4,000억원의 하천 정비계획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실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대하였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녕을 비롯한 4대강 인근 지자체들은 생존의 문제였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찬성했었다.
그리고 저는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후 4대강 인근에서는 매년 반복되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낙동강과 함께 생활해 왔기에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많은 호우 피해가 있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호우피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4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저감효과를 인정했었다.
4대강 주변 홍수위험구역 808㎢ 중 약 94%인 757㎢에서 홍수위험도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즉, 대부분의 구간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저감효과가 과학적, 객관적으로도 증명된 것이다.
그리고 가뭄예방에도 4대강 사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에서도 4대강이 가뭄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지난해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 강산이 타들어갔지만, 4대강 인근에는 가뭄 피해가 거의 없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더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연례행사처럼 닥쳐올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의 주장만 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정치적 논쟁을 벌이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나갈 시기다.
정리 / 유영숙 국장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30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제/사회

칼럼/기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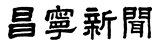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 천요강을 준 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