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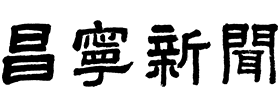
|
|
[서창호칼럼]현대 산업사회와 정부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잊고 있는지 모르겠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2일 입력 : 2024년 11월 12일
|
|
 |
|
| ⓒ 인터넷창녕신문 |
|
농업(農業)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뿌리이며 농사(農事)를 장려하는 농경사회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이제 농업(農業)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풍물(風物) 사물놀이 팀의 깃발에서나 볼 수 있는 유산이 되어 가고 있다.
산업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사회의 구조를 뒤바뀌어 놓았고 상공농사든 상공사농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에 밀려 물질만능주의에 편성한 패러다임(paradigm)이 변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는 대명제(大命題)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제도나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부자연스럽고 불행한 삶을 산다고 설파하였고 우리가 사농공상(士農工商)중에서 가장 자연과 가까운 삶이 농업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사회는 농경의 환경 친화적 1차 대표산업인 농업(임업, 축산업, 수산업 포함) 이외 모두가 사회제도의 영향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데 우선하여 현대화라는 명분 속에 자연을 역행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였고 자연은 재앙으로 인간의 삶에 제동을 걸기도 하지만 인간은 오만하게 현대 과학으로 자연을 극복했다는 경거망동함으로 자연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농업은 먹거리라는 사명감으로 조용히 자연에 순응하며 묵묵히 할 일을 이어가고 있다.
농업이 현대 산업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축소되어 농업을 등한시 하지만 우리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강조하며 생명유지의 근간인 농업을 강조하였다. 아무리 찬란하고 눈부신 산업사회의 경제 성장도 먹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농업 현실에 농민의 주업인 쌀농사의 비중이 아무리 축소되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생명유지의 창고가 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 우리의 주식인 쌀이 자치하는 비중이 미미할 지언정 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 밀 농업은 수입 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고 먹거리 가공 음식의 주재료인 수입 밀에 대한 안전성의 우려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 국민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에 자포자기한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미국이 선언한 “곡물 국유화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농업부채와 생산량의 문제로부터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곡물의 국유화의 명분은 농업 정책과 경제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곡물시장을 조절하여 농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농업의 안전성과 식량안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미국은 세계 곡물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곡물 메이저 회사들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카길을 비롯하여 콘티넨탈, 번지, 프랑스의 루이스 드레퓌스, 스위스의 앙드레 등과 캐나다와 호주의 밀 위원회는 국영 곡물회사와 함께 세계 곡물거래를 주도하며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곡물을 노골적으로 전략무기화 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한다.
세계 곡물시장의 현실을 볼 때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곡물인 쌀의 벼 수매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며 농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식량안보라는 정책의 도입에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들은 이미 곡물을 안보차원에서 전략 물자로 판단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곡물 쌀은 단지 먹거리 차원과 경제 논리의 근시안적 농업정책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땜질식 농민 달래기에 의존하고 미국의 곡물 국유화를 흉내 낸 벼 수매 정책의 접근방식 전면 수정과 미국의 곡물 국유화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농업정책에 적극 도입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민들의 쌀 소비의 현실화 방안에 최근 농업진흥청이 육종한 ‘가루쌀(바로미2)’의 보급을 서둘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입 밀에 의존하는 식자재를 가루쌀로 대체하여 수입밀의 의존으로부터 탈피하여 가루쌀의 건강한 식재료의 보급과 소비를 기대해 본다.
가을바람에 출렁이는 황금들판은 농심의 분노에 침묵하지만 농업정책은 생명창고인 쌀 생산량을 시장경제 논리의 접근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심(農心)을 헤아려 줄 정부 당국이기를 희망해 본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2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제/사회

칼럼/기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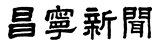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 천요강을 준 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