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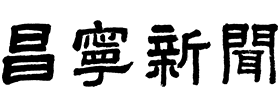
|
|
한정우칼럼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가뭄의 현장을 찾아서(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이야기)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27일 입력 : 2017년 07월 27일
가뭄의 현장을 찾아서(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이야기)
한정우 (창녕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법무사)
농번기를 지냈지만 계속되는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의 근심은 깊다. 지난해 가을에는 늦게까지 가을비가 많이 내려 양파, 마늘을 심는 시기를 놓쳐 애를 먹었다. 겨울에 얼어 죽는 현상을 막기 위해 창녕군에서는 비닐을 이중으로 덮도록 재배농가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올봄에는 강수량이 적어 양파, 마늘의 수확량이 예년의 75% 정도에 이른다는 농민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대신 현재까지 농협수매 및 판매가격이 괜찮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심
창녕관내 곳곳의 논, 밭을 다녀본다. 가뭄의 현장은 필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이 첨단사회에 그래도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만 되는 현실이 답답하다.
물을 대지 못해 모내기를 포기한 논도 군데군데보이고 겨우 모내기를 하였지만 물 부족으로 성장을 멈춘 이방면의 논 주인은 갈아엎고 올해 벼농사를 포기 해야겠다고 한다. 밭작물들도 화기를 타서 제대로 활착을 못하고 있었다.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내려 물 폭탄으로 대란인데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가뭄으로 난리다. 대부분의 저수지는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달창저수지와 옥천저수지도 거의 말라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를 둘러보았다.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진 두 보에서는 물보라를 내뿜는 물줄기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이 사업은 신규수자원의 확보와 수질개선, 홍수조절능력 확충, 여가문화공간의 설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구체적인 목표였다.
창녕함안보에서는 반갑게도 길곡에서 농사를 짓는 후배를 만났다. 마늘과 양파, 벼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의 경영주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올 해 같은 가뭄에 창녕함안보가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이다. 보의 물을 대거나 강물을 끌어 올려 모내기를 할 수 있었고 그러지 못했다면 모내기를 포기한 농가가 속출 했을 것이라 한다. 며칠 전 모임에서 만났던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했던 말과 같다.
중앙에서는 현지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현지 농민의 말을 듣기보다는 외지의 몇몇 단체에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데에 답답해했다. 이 가뭄철에 수문을 열어 담수된 물을 방류하라는 지시나 심지어 이참에 보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그만 웃어버린다.
주변 지하수의 수위를 높여 토지가 비옥해진다
첫째, 보에 고인 물은 농사에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매체에서 녹조가 섞인 물과 준설로 자극적인 영상으로 여론을 악화시키지만, 실제 농지에는 녹조가 있는 이 물도 논과 밭에 농업용수로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필요한 경우 농업용 정수기를 대어 물을 정화하여 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보의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에 물이 담기면 인근 농지의 지하수 수량이 풍부해지고 지하 담수의 수준이 높게 형성된다고 한다. 그래서 땅을 조금만 파도 지하수가 발견되고 토지가 비옥해진다고 한다.
상류의 농업비료가 녹조의 직접 원인?
둘째, 고인 물에서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담긴다고 쓰레기통이 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녹조란 농업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와 영양물질이 따뜻한 기온에서 형성되는 부유물질이다. 낙동강 상류의 논, 밭 지역에서 비료를 많이 사용하였기에 녹조가 만들어지며 하천을 흘러내려와 보에 고인 것이지, 고인 보에서 없던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주장은 사실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는 18,000여개가 넘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 모두 고인 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썩은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수량이 풍부하여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상승이 둔화된다. 따뜻한 온도에서 발생하는 녹조가 억제되는 것이다. 4대강 보를 열어 수위를 낮추자 녹조가 더 심해졌다는 뉴스기사는 그런 것이다.
행정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일부의 시각과 비판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녹조의 문제제기는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을 환기해준 점에는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칼럼의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정치적 해법은, 아래로 부터 생기고 현실 속의 사람들이 느끼는 동기로 인해 구체적 형태를 갖춘다. 정치적 해법이 이번 일의 사안처럼 문제해결의 답을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과해선 안 된다. 이번의 일이 문제인 것은 탁상의 공무원과 정치인이 현장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고,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로 결정해버린 데에 있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은 공동체를 오도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 특히 금번 보 개방의 문제가 된 이 사안은 우리 창녕에만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2개의 보가 있어 더욱 그렇다. 지역주민과 농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27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제/사회

칼럼/기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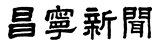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 천요강을 준 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