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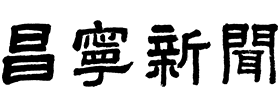
|
|
가야연맹체의 불교전래에 대한 소고
남중희(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부소장)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30일 입력 : 2021년 04월 30일
|
 |
|
| ⓒ 인터넷창녕신문 |
|
한반도 고대국가 발전과 불교의 전래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가야의 불교전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중에서도 1세기의 김해 가락국 건국 초기에 허 왕후가 배를 타고 올 때 항해의 안
전을 기원하여 싣고 왔다는 파사 석탑 및 왕후사 건립과 관련하여, 인도 지역의 남방 불교가 이 곳에 직접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
 |
|
| ⓒ 인터넷창녕신문 |
|
파사석탑 경남문화재자료제227호
‘삼국유사’의 탑상 편에 실려 있는 금관성 파사석탑 조의 기록을 따르면, 파사석탑은 서기 48년에 허황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지고 왔으나 당시 불교로서 이해되지는 못했고, 452년에 호계사를 창건하여 파사석탑을 안치하고 왕후사를 창건했다는 것이다. 파사석탑이 인도에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 남방불교 전래가 있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아유타국이라는 이름은 인도에서도 불교와 가장 인연 깊은 나라였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하여 허왕후 결혼설화속에 삽입되었고 그 시기는 왕후사가 창건 당시인 신라 중대였을 것이다. 무열왕계의 김씨가 신라 왕실을 운영하던 신라 중대는 가야계 신김씨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였고, 가야 왕실의 후손들은 신라 왕실의 비호를 받아 금관소경의 우월성이 강조되던 무렵이었다. 김해 호계사에 있었다는 파사석탑 설화의 성립시기는 고려 초 중기였을 것이다. 지금은 파사석탑이 허왕후릉 전각에 보존되고 있다. 파사석탑의 현재 모습은 네모난 모습의 돌들이 포개져 있고, 돌의 재질도 화강암이 아니라 무른 종류여서 일반적인 한국 석탑의 계보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에서 직접 전래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대가야가 불교를 수용하였는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불교식 인명들이다. 대가야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의 어머니인 정견모주(正見母主)가 나오고, 6세기 당시 대가야 왕이었던 이뇌왕(異腦王)과 아들인 월광태자(月光太子)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은 불교식이다. 정견모주의 ‘정견(正見)’은 불교에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수행 방법인 팔정도(八正道) 첫 번째 단계의 이름이다. 또한 ‘월광태자’는 석가모니가 전생에 국왕의 아들로 태어나 선행을 베풀었을 때의 이름이다. 이는 불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진 시대의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가야의 불교식 이름은 언제 나타났을까? 가야산 해인사는 신라 애장왕 때에 대가야 왕족의 후손인 순응과 이정이 가야산신 정견모주에 대한 제사 터를 확장해 창건한 것이다. 현재 해인사 안에는 조선시대 후기까지 ‘정견천왕사’라고 불리던 ‘국사단’이라는 건물이 있었다. 가야연맹의 제사는 맹주국인 대가야국에서 각국의 대표자인 한기들이 모여 공동으로 행해졌는데, 제사 행렬은 가야 연맹의 성소(聖所)인 가야산 정견모주 사당에서부터 시작되어 고령 읍내로 이어졌을 것이다. 6세기 당시 대가야가 불교를 받아들여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주변국의 고구려나 백제는 이미 4세기 후반 소수림왕 및 침류왕 때부터 불교를 인정했고, 신라에 5세기 전반 눌지마립간 때 고구려의 승려들이 왕래했으므로, 가야에서도 불교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대가야 이뇌왕은 522년에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고 밀접하게 교류하던 중 528년에 불교를 공인한 신라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뇌왕의 아들 도설지를 월광태자로 명명한 것과 함께 대가야 왕계의 인명을 불교적으로 바꾼 시기는 대가야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은 522년 이후 562년 멸망하기 전까지로 추정된다. 대가야의 불교 수용 문제는 중국 남제 및 백제와의 교류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대가야가 불교를 이해하고 있었을 개연성으로는 첫째로 우륵 12곡 가운데에 ‘사자기(師子伎)’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중국 남조의 기악(伎樂)인 사자춤에서 사자는 부처님이 보낸 것이기도 하고 그 춤 자체가 사원에서의 장례나 법회에 쓰이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대가야는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을 개연성도 있다.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은 석실의 터널식 천장 구조가 공주 송산리 벽화전분과 유사하고, 천장에 그려져 있는 연꽃무늬는 부여 능산리 벽화고분과 상통한 양식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가야가 불교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방증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야에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가야에 불교가 전파되었다는 증거들은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 전기 가야시대 보다는 후기 가야시대에 불교가 전파된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불교문화가 꽃 피우기도 전에 가야가 멸망하는 바람에 이렇다 할 불교 유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30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제/사회

칼럼/기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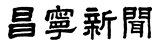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 천요강을 준 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