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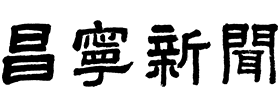
|
|
옥(玉) 장신구를 좋아했던 가야인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5일 입력 : 2021년 07월 05일
|
 |
|
| ⓒ 인터넷창녕신문 |
| 그 민족의 유래와 특성은 남긴 유물을 보면 알 수 있다. 흔히들 가야를 철의 왕국으로 부르지만 유달리 옥(玉)혹은 유리구슬 장신구들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을 좋아했던 이나 신라나 스키타이계열하고는 다소 결이 다르다. 삼국지위지동이전에 “가야인들은 구슬을 보배로 삼아 혹은 옷을 꿰어 장식하고 혹은 목에 걸고 귀에 달았지만 금·은·비단은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고 기술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가야를 대표하는 대성동 및 양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등 목걸이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 예고된 목걸이 3건은 다양한 장신구로 세공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유물이다. 대성동 76호 고분에서는 수정구슬 10점, 마노제 구슬 77점, 각종 유리제 구슬 2,386점 등 총 2,473점이며 평균 지름이 6~7mm 정도로 아주 작은 형태로 세공되었는데 출토의 정황이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좋아 보물급 유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가야인들은 수정이나 마노를 주판알 모양으로 깎거나 유리 곡옥이나 둥근 옥을 만들어 목걸이로 착용했다. 구슬의 재질도 금, 은, 유리, 금박 입힌 유리, 수정, 호박, 비취 등으로 다양했다. 형태도 판옥 곡옥, 대롱옥, 다면옥이다. 맑고 투명한 수정과 주황색 마노, 파란색 유리 등 다양한 재질과 색감을 조화롭게 구성한 것이 특색이다. 유리를 곡옥(曲玉)이나 다면체 형태로 섬세하게 가공하고 세밀하게 구멍을 뚫어 연결하거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등 조형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는 1992년 토광목곽묘에서 발굴됐다. 양동리 270호 고분의 대부분은 훼손된 상태였으나 고배(高杯)를 비롯해 토기류나 철제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알려 주는 중요한 고분으로 꼽힌다. 이 목걸이’는 수정제 다면옥(多面玉) 20점과 주판옥 120점, 곡옥(曲玉) 6점 등 총 146점의 수정으로 구성됐다. 전체 약 142.6cm의 길이에, 육각다면체 형, 주판알형, 곡옥형(曲玉形) 등 여러 형태로 수정을 다듬어 연결했다. 제작 시기는 고분의 형식이나 부장품 등으로 보아 3세기로 추정된다. 수정목걸이는 영롱하고 맑은 투명 무색과 황색, 갈색 등이 약간 섞인 은은한 색의 수정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었다. 형태와 크기가 다른 수정을 조화롭게 배치해 조형성이 매우 뛰어났다.
김해 양동리 322호분 곡옥(曲玉)
그동안 목걸이를 구성하고 있는 수정(水晶)은 한동안 외국산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학계의 연구를 통해 경상남도 양산, 의령 등 국내의 자수정 산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야인들은 경도 7의 단단한 수정(水晶)을 다면체로 가공하거나 많은 수량의 곡옥 형태로 섬세하게 다듬은 제작 방법은 가야인들의 옥(玉)세공기술의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는 가야가 철의 왕국이면서도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수정목걸이는 3세기 전후의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지배계층의 장신구이다. 3~4세기 다수의 가야 유적에서도 수정 목걸이들이 출토되었나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 목걸이처럼 100여점 이상의 수정으로만 구성된 사례는 드물다. 또 한 그 세공 기법도 현대의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조형미가 넘치는 걸작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가야 목걸이 3건은 각각의 유적에서 일괄 발견이 되었고, 금관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 중 많은 수량의 구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희귀한 사례이다. 따라서 가야인들은 금 보다는 옥(玉) 장신구들을 선호한 것으로 신라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지배계층의 신분을 상징하거나 그 권위를 장신구를 통해 드러내었음을 실증적으로 말해 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금과 은을 주로 다룬 신라, 백제인들과는 달리 수정이나 유리구슬을 선호한 가야인들의 결이 다른 문화적 배경이 궁금해진다. 추가적인 학술연구 등을 통해 가야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5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제/사회

칼럼/기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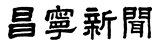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 천요강을 준 수함
|
|